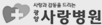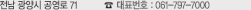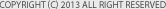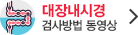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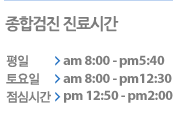

제목
억울하고 답답한 ‘의료사고’,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
# 임신 6주의 a 씨는 심한 입덧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해 영양주사를 처방받고자 병원에 내원했다. 하지만 병원에서는 a 씨를 계류유산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b 씨와 착각해 영양제 대신에 수면마취제를 투약했다. 그리고 다음 날 a 씨는 심한 하혈로 병원을 찾았고 그때서야 아기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

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,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의료사고 중 하나다. 이처럼 당사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,589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눈물로 얼룩진 ‘의료사고’,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
좋은 치료를 받고 잘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의 입장에선 ‘당혹’ 그 자체일 것이다. 특히, 의료사고는 ‘의학’이라는 전문분야에 속하기 때문에, 환자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회복까지 못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이다. 즉,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의료사고다.
그렇다고 마냥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.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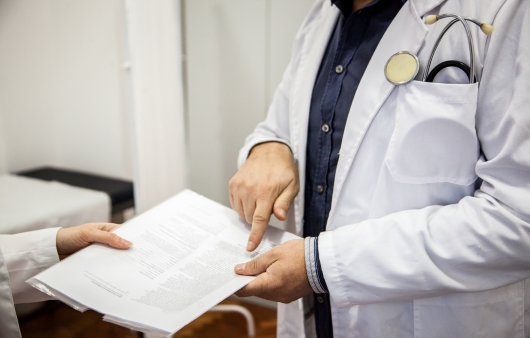
1. 절대 흥분하지 마라
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당황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, 폭행, 물리적 충돌, 1인 시위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.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.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의료사고에서 업무방해 또는 폭행 사건으로 뒤바뀌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탈바꿈될 수 있다.
2.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고, 모든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라
의료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을 때 즉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찾아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. 그래야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. 필요하다면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 경위와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정리해 두도록 한다. 이는 추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동시에 모든 진료기록부 동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. 이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. 의료법 21조 1항에 따르면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. 만약 거부한다면 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·고발할 수 있다.
3. 의료기관과 처리방안을 협의하라
병원에는 보통 법무팀, 적정진료팀, 고객만족팀, 원무팀 등의 부서가 존재하고, 여기에서 민원이나 의료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 따라서 해당 부서와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. 만약 병원 내 해당 부서가 없다면 원장과 직접 해결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.
만약 병원과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·중재제도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,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.
출처: 건강이 궁금할 땐, 하이닥 (www.hidoc.co.kr)

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,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의료사고 중 하나다. 이처럼 당사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,589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눈물로 얼룩진 ‘의료사고’,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
좋은 치료를 받고 잘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의 입장에선 ‘당혹’ 그 자체일 것이다. 특히, 의료사고는 ‘의학’이라는 전문분야에 속하기 때문에, 환자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회복까지 못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이다. 즉,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의료사고다.
그렇다고 마냥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.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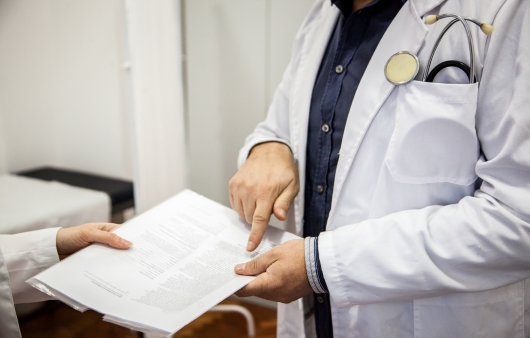
1. 절대 흥분하지 마라
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당황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, 폭행, 물리적 충돌, 1인 시위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.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.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의료사고에서 업무방해 또는 폭행 사건으로 뒤바뀌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탈바꿈될 수 있다.
2.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고, 모든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라
의료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을 때 즉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찾아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. 그래야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. 필요하다면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 경위와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정리해 두도록 한다. 이는 추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동시에 모든 진료기록부 동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. 이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. 의료법 21조 1항에 따르면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. 만약 거부한다면 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·고발할 수 있다.
3. 의료기관과 처리방안을 협의하라
병원에는 보통 법무팀, 적정진료팀, 고객만족팀, 원무팀 등의 부서가 존재하고, 여기에서 민원이나 의료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 따라서 해당 부서와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. 만약 병원 내 해당 부서가 없다면 원장과 직접 해결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.
만약 병원과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·중재제도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,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.
출처: 건강이 궁금할 땐, 하이닥 (www.hidoc.co.kr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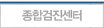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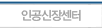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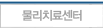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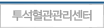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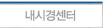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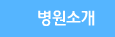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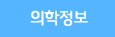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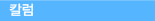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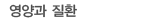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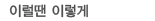

 이전글
이전글 다음글
다음글